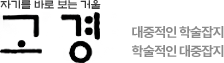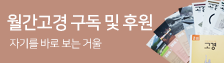[선어록의 뒷골목]
병 속의 새? 그럴 일 없다.
페이지 정보
장웅연 / 2015 년 11 월 [통권 제31호] / / 작성일20-05-22 08:32 / 조회5,274회 / 댓글0건본문
야구에는 ‘BABIP(Baseball Average on Balls In Play)’이란 통계지표가 있다. 인플레이 된 타구, 곧 타자가 때려서 파울라인 안쪽에 떨어진 공이 안타가 될 확률을 뜻한다. BABIP이 높을수록 타율이 올라가는 건 당연지사. 그래서 BABIP의 고저는 타자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좌우할 거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BABIP의 가장 중요한 상승요인은 ‘운(運)’이라는 것이(63%), 미국의 어느 야구통계학자에 의해 판명됐다. 실제로 프로야구에선 타자에 따라 BABIP이 1할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운칠기삼(運七技三)이란 시쳇말이 단순한 속설을 넘어 법칙임을 증명하는 사례다.
한편 이렇듯 실력이 아닌 요행이 지배하는 경기라면 선수들은 기술을 연마할 의욕을 잃기 십상이다. 관중들도 차라리 야바위를 구경하는 게 낫겠다며 좀처럼 경기장을 찾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게임을 계속할수록 BABIP은 기어이 해당 선수의 평균적인 타율로 수렴된다는 점이다. 시간의 힘과 인내의 힘을 보여주는 BABIP의 진실은, ‘야구는 인생의 축소판’이란 잠언에 무게를 실어준다.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길게 봐야 한다는 것. 외부적인 조건에 얽매이거나 휘둘리지 않는 것. 나 자신을 믿는 것. 마음은 추스르고 몸은 닦는 것. 무심(無心)은 뚝심이다.
제30칙
대수의 지옥불(大隨劫火, 대수겁화)
어떤 객승이 대수법진(大隨法眞)에게 물었다. “겁화가 활활 타오르면 삼천대천세계도 무너진다는데 그러면 ‘이것[這箇]’도 함께 무너집니까?” 대수가 대답했다. “그럼, 무너지고말고.” 객승이 일렀다. “그렇다면 저는 그를 따라가겠습니다.” 대수가 말했다. “따라가거라.”
훗날 누군가 용제소수(龍濟紹修)에게 가서 똑같이 물었다. 용제는 대수와 달리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다 같은 대천세계이기 때문이지.”
겁화(劫火)는 세상의 종말인 괴겁(壞劫)에 일어나는 큰불을 가리킨다. 삼천대천세계(三千大天世界)는 우주 전체이며, 저개(這箇)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진리의 당체(當體)를 뜻한다. 대수는 세계가 사라지면 불법(佛法)도 사라질 것이라고 잘라 말하고 있다. 부처님도 하나님도 믿음도 수행도 지구멸망 앞에선 ‘말짱 꽝’인 셈이다.

객승은 목숨을 걸고 깨달음을 구하던 벽창우였을 것이다. 도(道)가 불타 없어지는 게 몹시 안타까웠는지 겁화를 따라가겠단다. 쉽게 말해 분신하겠다는 것이다. 객승의 위법망구(爲法忘軀) 정신이 활화산이라면, 대수의 무심함은 시베리아 얼음장이다. ‘그래, 타죽으라’며 등을 떠미는 모양새다. 냉혹한 노인네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게 마련이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지만 어쩔 수 없이 허망한 일이다. 허망함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허망함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객승은 죽음을 택했다. 대수가 자살을 방조한 까닭도 이러한 연유로 보이는데, “따라가거라.”는 말투엔 일견 조롱기가 섞여 있다. 앞뒤 못 가리는 불나방을 무슨 수로 말리겠냐는 듯.
진리가 궁극엔 어느 하나로 수렴된다고 믿는 경향은 보편적이다. 신(神)이라든가 하늘이라든가 도(道)라든가 등등. 반면 선사들은 무엇보다 실체화를 철저히 경계했다. 맹신을 유발하는 탓이고 폭력으로 이어지는 탓이다. 꽃의 진면목은 꽃잎에도 줄기에도 뿌리에도 따로 있지 않다. 꽃의 전체와 꽃이 살아온 날들의 총합이 꽃이다.
이른바 ‘내면(內面)’에 대한 신뢰도 의뭉스럽다. ‘마음의 소리’는 그럴듯하지만 망상일 따름이다. 열매의 본질은 씨앗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의 의미는 깊이가 아니라 선택에서 드러난다. 오랜 고민은 결코 정답이 될 수 없다. 다만 확률을 높일 뿐이다. 결단과 책임에서 참다운 자유가 싹튼다.
『선가귀감(禪家龜鑑)』은 “중생의 마음을 버릴 것 없이 다만 더럽히지만 말라.”고 했다. 진실이란 이름으로 혹은 양심이란 이름으로 마음에 자꾸 뭘 쌓아두어 어지럽히지 말라는 이야기다. 시답잖게 흘러가는 낱낱의 일상이 모여 삶이 되는 법이다. 어딘가 다른 곳을 구하는 순간, 지금 여기는 감옥이 된다. 한쪽만 보고 죄악이라 욕하면서.
대천세계가 마음에서 일어난 땅이듯 ‘참나’ 역시 마음에서 일어난 한 조각 불똥이다. 이른바 ‘참나’란 영원하고 고귀한 ‘나’라는 상태가 아니라, 특별히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통찰이다. 감인대(堪忍待). 이러니저러니 해도 삶은 결국 견딤이고 참음이고 기다림이다. 정진의 출발은 그리하여 멈춤이고 정진의 대가는 쉴 줄 아는 힘이다.
제31칙
운문의 노주(雲門露柱, 운문노주)
운문문언(雲門文偃)이 다음과 같이 일렀다. “법당의 옛 부처님과 노주가 한판 붙었으니 이는 어찌 된 영문인가?” 대중이 말이 없자 스스로 대신 말했다. “남산에 구름이 일어나니, 북산에 비가 내린다.”
조사선에 힘입은 도인들은 격외(格外)를 즐긴다. ‘격’이란 세속의 규격,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짜 맞춘 틀을 의미한다. 따라야 하고 따르지 않으면 따돌림을 당하는 관습, 상식, 통념 등이 포함된다. 규격화된 인간이 잘 사는 법이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제 살을 도려내고 뼈를 깎아가며 틀 안을 비집고 들어가 사람대접을 받기 위해 애쓴다.
반면 격외란 규격의 바깥을 따르는 길이다. 흔히 자유 혹은 초월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거대한 순응에 가깝다. 볼품없는 대로 비뚤어진 대로 살아가는 일이다. 법당의 불상과 기둥이 들붙어 한껏 놀아나더라도, 기겁하거나 욕하지 않고 그냥 봐준다. 구름은 남산 위에 끼었는데 정작 비는 북산에서 내리더라도, 목마름에 절망하지 않는다.
개선될 순 있어도 소멸하진 않는 것이 모순이다. 살다보면 내 다리를 긁었는데 남이 시원해하고 열심히 걷는다고 걸었는데 항상 벼랑과 마주하는 일이 적지 않다. 결국엔 ‘걸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그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누구도 넘나들 수 없는 역사요 양심이므로.
제32칙
앙산의 마음과 경계(仰山心境, 앙산심경)
앙산혜적에게 어떤 객승이 찾아왔다. “어디서 왔는가?” “유주(幽州) 사람입니다.” “그대는 그쪽 일을 생각하는가?” “항상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자는 마음이요 생각하는 바는 경계다. 그러니 그곳의 산하대지 누대 전각 인간 가축 등의 물건에 대하여 생각하는 그놈을 돌이켜 생각해보라. 그 여러 가지가 있는가?” “저는 거기에 이르러 전혀 보이는 게 없습니다.” 이에 앙산은 “믿음의 지위는 옳으나 사람(수행)의 지위는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궁금했던 객승은 “화상께서 따로 가르쳐주실 것이 있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앙산의 대답이다. “따로 있다거나 따로 없다거나 하면 맞지 않는다. 그대의 소견을 보니 겨우 하나의 현묘함만을 얻었을 뿐이다. 앉을 자리를 얻어 옷을 걸치게 되거든 그 뒤부터 스스로 살펴보라.”
“원(圓) 안에 들어가도 몽둥이 30방, 들어가지 않아도 30방”이란 화두는 유명하다. 스승은 생사의 경계를 뛰어넘으라며 이런 식으로 제자를 궁지에 몰아넣는다. 여하튼 난해한 문제인데, “스승이 땅바닥에 그려놓은 원을 슬며시 지우면 된다.”는 누군가의 답변이 솔깃하다. 생사의 경계가 본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하는 재치다.
그러나 한편으론 답을 찾기 위해 골몰하는 일 자체가 경계에 휘둘린 꼴이다. 남에게서 인정받기 위해 마음에 약을 치고 분을 발랐으니, 영락없이 작위(作爲)다. 이른바 ‘사자새끼’들이 몽둥이를 들고 씩씩거리는 노인네를 냅다 밀어버린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너 따위가 뭔데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느냐’는 기백의 몸짓이다.
더구나 답을 찾는다손 잔머리의 결실일 뿐이다.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둥 인기를 얻어야 한다는 둥 세간의 통념이 부추기는 길에서 원숭이놀음을 벌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무심(無心)이란 남이 쳐놓은 그물에 걸리지 않는 것이다. 병을 깨지 않고 병 속에서 새를 꺼내보라고? 병 속에 새가 들어갈 일이 없다.
저작권자(©) 월간 고경.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많이 본 뉴스
-

30여 년 만에 금빛 장엄을 마친 고심원
어느 날 큰스님께서 부르시더니, “원택아! 내가 이제 장경각에 있는 책장을 열 힘도 없어졌다. 그러니 장경각에 들어가면 책장을 열지 않고도 책을 자유롭게 뽑아 볼 수 있게 장경각을 새로 지어야겠다.…
원택스님 /
-

죽은 뒤에는 소가 되리라
오늘은 친구들과 모처럼 팔공산 내원암 산행을 합니다. 동화사 북서쪽 주차장에 내리니 언덕을 밀고 대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멀리 팔공산 주 능선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팔공산 능선을 바라보면 언제나 가…
서종택 /
-

연꽃에서 태어난 사람 빠드마 삼바바
‘옴 아 훔 바즈라 구루 빠드마 싣디 훔’ ‘마하 구루(Maha Guru)’에게 바치는 만트라(Mantra, 眞言)이다.지난 호에 『바르도 퇴돌』의 출현에 대한 글이 넘쳐서 이번 달로 이어…
김규현 /
-

참선 수행의 무량한 공덕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설사 억천만겁 동안 나의 깊고 묘한 법문을 다 외운다 하더라도 단 하루 동안 도를 닦아 마음을 밝힘만 못하느니라.” 붓다의 참선과 아난의 글&nb…
성철스님 /
-

붓다의 생애와 본생도
우리나라에는 부처님의 전생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돈황 벽화에는 부처님의 전생에 관한 이야기가 개굴 초기부터 많이 그려졌다. 불교의 영혼불멸, 인과응보, 윤회전생의 교의에 따…
김선희 /
※ 로그인 하시면 추천과 댓글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